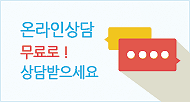서론: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의 패러다임 전환
2021년 4월 8일 선고된 대법원 2019후10609 판결은 대한민국 특허법,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한 역사적 판결이다. 선택발명이란 선행기술에 넓게 개시된 상위개념으로부터 특정 하위개념을 선택하여 구성한 발명을 말한다. 과거 한국 법원은 이러한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선행발명 대비 ‘질적으로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진정한 기술적 창작성이 있는 발명조차 특허 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특허법리와도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9후10609 판결은 이러한 ‘현저한 효과’ 중심의 법리에서 벗어나, 발명을 완성하기까지의 ‘구성의 곤란성’을 진보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격상시켰다. 즉, ‘그 발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 판결은 단일 사건의 해결을 넘어, 한국 특허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산업계에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된다.
사건의 경과: 아픽사반 특허 분쟁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이 보유한 항응고제 ‘엘리퀴스’의 주성분인 ‘아픽사반’에 대한 물질특허(특허 제0908176호) 무효 소송이었다. 제네릭사들은 선행발명인 국제공개특허(WO00/39131)에 아픽사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선행발명이 방대한 범위의 화합물을 포괄하는 마쿠쉬(Markush) 화학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 화학식으로부터 아픽사반이라는 단 하나의 특정 화합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66개의 가능한 기본 골격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시 여러 치환기를 방대한 목록에서 정확히 조합해야 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화합물의 수는 ‘수억 가지 이상’에 달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당시의 지배적 법리에 따라 아픽사반이 선행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개의 화합물 중에서 아픽사반을 특정하는 것의 어려움, 즉 ‘구성의 곤란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진보성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진보성 판단의 순서와 무게중심을 바꾸는 역사적 결정이었다.
새로운 법리: ‘구성의 곤란성’의 부상과 ‘효과’의 재정의
대법원 2019후10609 판결은 선택발명을 더 이상 특별 취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발명과 동일한 진보성 판단 법리 내로 포섭했다.
‘구성의 곤란성’의 우선적 고려: 대법원은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더라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효과의 현저성만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분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① 선행발명에 포함된 화합물의 총 개수, ② 특정 화합물을 선택할 동기나 암시의 부재, ③ 선행발명의 구체적 실시예와의 구조적 차이 등을 제시했다. 아픽사반 사건의 경우, 수억 개의 선택지 중 아무런 지침 없이 특정 화합물을 선택하는 것은 구성이 곤란하다고 보기에 충분했다.
‘효과’의 역할 재정의: 이 판결이 효과의 중요성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효과를 ‘구성의 곤란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재배치했다. 즉, 예측하지 못했던 뛰어난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는 그 발명이 단순한 임의의 선택이 아니라 창작적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물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제 효과는 진보성의 전제조건이 아닌,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핵심 증거가 되었다.
기존 판례와의 관계: 대법원은 ‘현저한 효과’를 요구했던 기존 판례(2008후736 등)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그 적용 범위를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법리 변화를 이끌어낸 세련된 사법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 및 실무적 영향
이 판결은 한국의 특허법리를 국제 표준에 근접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주요국 법리와의 비교: 과거 한국의 ‘현저한 효과’ 기준은 일본 특허청(JPO)의 심사기준과 유사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리는 발명의 동기나 암시의 부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럽 특허청(EPO)의 ‘문제 해결 접근법(problem-solution approach)’ 및 ‘could-would 테스트’와 매우 유사해졌고, 발명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미국(USPTO)의 비자명성 판단 법리와도 궤를 같이하게 되었다.
실무적 영향:
특허 소송: 아픽사반 소송은 결국 BMS의 승리로 확정되었고, 이미 출시된 제네릭들은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다. 이는 제네릭사의 ‘위험 감수 출시(at-risk launch)’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켰다.
특허 출원 전략: 혁신 기업은 명세서에 ‘구성의 곤란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도전자인 제네릭사는 선행기술에 발명으로 나아갈 ‘동기’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양측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장 영향: 혁신 기업의 특허 보호가 강화되어 R&D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제네릭사의 시장 진입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픽사반 제네릭들은 특허 유효 판결 후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 실제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론 및 향후 과제
대법원 2019후10609 판결은 경직된 ‘효과’ 중심의 법리를 ‘구성의 곤란성’을 핵심으로 하는 유연하고 종합적인 분석 틀로 대체함으로써, 대한민국 선택발명 법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는 한국 특허법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진정한 기술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진전이다.
다만, ‘어느 정도여야 곤란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정량적 기준의 부재,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구성의 곤란성’ 개념에 미칠 영향, 그리고 재해석된 구(舊) 법리와의 관계 설정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법리적 진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킨 중요한 사법적 성과로, 특허 제도의 본질적 목표에 충실한 판결로 평가받아 마땅하다.